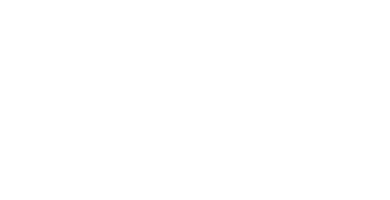따뜻하게 배웅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며
연고 없는 고인들의
마지막을 지켜온 장례지도사
강봉희 씨

강봉희(70) 씨에겐 동의어인 낱말들이 있다.
생(生)과 졸(卒)이 그렇고,
죽음과 웃음이 그렇다.
쓸쓸했던 죽음들을
존엄하고 따뜻하게 배웅하면서,
비움과 나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죽음에서 삶으로,
비움에서 나눔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음들이 있어요.
홀로 돌아가셨거나
가족과 인연이 끊긴 분들,
장례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의 장례를 치러드려요.
외롭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따뜻이 배웅해 드려야죠.”
한때 그는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
대구에서 건축업을 하던 그는
마흔세 살이던 1996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4기로 넘어가는 단계였다.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잇달아 받고 마침내 병석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3년 뒤 암이 재발했고,
그 힘든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2002년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입원해서 온종일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에 한 장면이 유독 마음을 흔들었어요.
병실 바로 옆이 장례식장이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시신을 싣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만약 살아서 여길 나간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지,
비우고 나누면서 인간답게 살아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꿈이 그렇게 생겼어요.”

홀로였던 죽음들을
같이 돌보는 보람
그는 또 한 번 암을 이겨냈고,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과에서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학업을 마친 2004년 11월엔
함께 공부한 장례지도사 선후배들과
봉사단을 꾸렸다.
장례지도사인 그는
장례로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사람의 도리를 했다는 마음.
얻는 수익이라곤 단지 그것뿐이다.
그가 이끄는
(사)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도
마찬가지다.
대표인 그를 포함해 이사 여섯 명과
감사 두 명이 장례의 전 과정을 진행하고,
필요경비는 여덟 명의 운영진이
매월 백만 원씩 내가며 충당했다.
2023년 현재 봉사단의 회원은 약 300명.
그중 회비를 내는 회원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봉사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제법 큰 힘이 된다.
덕분에 지금은
그와 동료들의 경제적 부담이
처음보다는 줄어든 상태다.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는
고인의 90% 정도는
관(官)에서 의뢰해오는 분들이에요.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오면
시신 수습부터 안치, 염습(殮襲), 입관,
화장, 유골 수습, 봉안까지 모두 진행해 드려요.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에요.”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면
유족에게 알려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꽤 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죽음들.
그 마지막이 너무 쓸쓸해서
자주 목이 메어온다.
고독사로 생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경우
가슴이 더 미어진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누군가 조금만 돌봐줬다면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토록
험하진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오며 가며 같이 들여다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며 살다가 농담하며 죽는 꿈
조용히 해온 봉사가 세상의 이목을 끈 건
2020년 2월 대구 코로나19 확산 때다.
대구시청 담당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때라
자신이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두려웠지만
주변 의사에게 자문 받은 끝에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힘을 못 쓴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한번 해보기로 했다.
“동료들에게 같이하자는 전화를 돌렸어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자고
이내 답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장례 봉사를 해오면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오고 있어요.
하나는 유가족들에게 가족사를 묻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는 거예요.
슬프게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죽음을 돌보는 일이 ‘사람답게’
사는 일로 어느덧 이어져 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그의 말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된다.
2007년 건축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그는
그 선택이 자신을 살렸다고 생각한다.
봉사가 전업이 되니 욕심이 절로 사라졌고,
비워진 마음 안으로 웃을 일이
가득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꿈꾼다.
봉사하며 살다가 농담하며 죽기를.
그 꿈을 입증하는 사진 하나가
봉사단 사무실 벽에 걸려있다.
그가 익살스레 웃고 있는 사진이다.
그는 그걸 영정사진으로 쓸 생각이다.
죽음과 웃음이 하나다.
무거웠던 마음이 문득 가벼워진다.
'Now > 사회공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손으로 하나되어 이야기 (0) | 2023.10.23 |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김정심 씨 이야기 (0) | 2023.10.20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대상 / 상록야학 이야기 (0) | 2023.10.18 |
|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제23회 우정선행상 시상식 개최 (0) | 2023.09.19 |
| [살맛나는 세상] 큰 사랑을 본받고 싶은 마음 (1)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