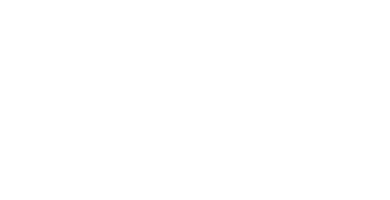오직 오늘뿐,
봉사로 채워갈 바로 지금뿐
온갖 질병과 사투하며
42년간 이·미용 봉사해온
김정심 씨

"내일이 없다."
김정심(77) 씨는 이 말을 자주 쓴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생애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를 하루를
아름답게 보내겠다는 의미다.
이십 대부터 지금껏
온갖 질병과 싸워온 그는 몇 차례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산다.
봉사가 그 비결이다.
42년간 거의 매일 실행해온 나눔이,
죽음에서 삶으로 그를 이끌고 간다.
후회도 걱정도 없다.
그에겐 오직 봉사로 채워가는 ‘오늘’뿐이다.

고통의 늪에서 봉사의 숲으로
“그게 참 신기해요.
각종 통증에 시달리다가도,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언제 아팠냐는 듯 말짱해져요.”
고통에서 그를 구하는 건
언제나 의사보다 ‘봉사’가 먼저다.
젊은 날부터 그는
늘 질병과 함께였다.
첫아이를 업고 다니던
이십 대의 어느 날
가슴이 심하게 뛰어 병원에 갔다가
생애 첫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어떡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그때 처음 생각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였다.
또 하나의 큰 병이 그를 찾아왔다.
갓난아기였던 셋째를 씻기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강직성 척추염이었다.
“힘들게 일했다 싶으면 척추뼈가
하나씩 튀어나왔어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절로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값지게 지내기로요.”

1980년 미용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후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의 머리를
수시로 잘라주는 것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미용실을 차리지는 않았다.
배움이 나눔에 쓰이기 바랐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이·미용 봉사를 시작한 건
1985년에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한복 짓는 법을 배우던 무렵이었다.
“우리에게 한복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이·미용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미용 기술이 없는 본인보다
제가 더 적임자일 것 같다며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미용봉사단을
소개해 주셨죠.
그때부터 봉사가 제 삶의 1순위가 됐어요.”

맨 처음 봉사하러 간 곳은
대방동에 있던 옛 서울시립남부부녀보호소다.
당시 그곳 시설이 매우 열악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러와서
봉사자들이 퍽 힘들어했다.
어느 날 그곳의 한 분이 그에게 말했다.
2층에도 사람들이 있으니
머리를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분을 따라 올라가니 소변이 흥건한
비닐 위에 거동이 안 되는 이들이 그대
로 누워있었다.
밀려오는 감정들을 모두 지우고,
담담하고 묵묵하게 그분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그렇게 2층 전담이 됐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경험이
그에게는 어느덧 ‘용기’라는 이름의
자산이 돼줬다.
요셉의원에서 노숙인들의 머리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해방모자원과 성심모자원 등
소외된 여성들이 있는 곳을 따로 또
같이 찾아가 미용 봉사를 이어갔다.
어르신들도 열심히 만났다.
난곡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미용 봉사를 하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즉시 달려가 머리를 손봐드렸다.
“1993년부턴
관악구립중앙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시작할 땐 그곳 분들이
제 부모님 연배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 또래가 됐어요.
코로나19 이후엔 각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잘라드려요.
한 분 한 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2000년 관악구립중앙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이곳과 인연을 맺은 그는
비전향장기수 어르신들의 머리를
매달 잘라드리면서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깊이 알게 됐다.
어르신들의 1차 송환 땐
그가 머리를 잘라드렸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 ‘예쁘게 잘라 달라’며
환히 웃던 얼굴들을 그는 잊지 못한다.
남아 있는 어르신들과는 가족처럼 지낸다.
서울의 한 동네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마당 가득 온갖 채소와
나무를 심어놓은 어르신들은
손수 기른 작물들을 그에게 매번
한 아름씩 안겨준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번번이 가슴이 뭉클해온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르신들이 면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생애 마지막 날이
‘봉사일’이기를 꿈꾸며
“ 그 몸으로 무슨 봉사냐는
말을 지겹게도 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10여 년 전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이에요.
병원에선 그때 저에게
석 달도 채 살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내일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요.
삶의 마지막 날 가장 하고 싶은 일,
저에겐 그게 봉사예요.”
지난 40여 년 동안 그의 일주일은
거의 나눔으로 채워졌다.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자신에게 수시로 물어온 날들.
그에 대한 답을 차곡차곡
삶으로 옮겨온 반평생이다.
앓고 있는 질병이 많아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먹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청명한 가을하늘 같다.
요일별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기꺼이 해왔다.
늘 걷던 나눔의 길에 그는
매일 처음처럼 발을 디딘다.
날마다 초심(初心)이니 오늘도 꽃길이다.
'Now > 사회공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걸음 기부 앱 '빅워크'와 함께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 ‘꿈을 향한 삼남길 트레킹’ (0) | 2023.10.25 |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손으로 하나되어 이야기 (0) | 2023.10.23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강봉희 씨 이야기 (0) | 2023.10.19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대상 / 상록야학 이야기 (0) | 2023.10.18 |
|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제23회 우정선행상 시상식 개최 (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