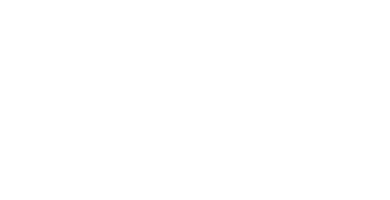배움의 나무로, 희망의 숲으로
제때 배우지 못한 이들의 47년 배움터
상록야학

상록야학이 세워진 건
1976년 3월 7일의 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들에게
상록야학이 한 줌 빛이 되어 주는 것.
故 박학선 교장이 생전에 소망했던 일이다.
중·고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학 공부까지 하는 늦깎이 학생이
이 학교에는 많다.
8,000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상록야학이
‘늘 푸른 학교’를 넘어
‘더 푸른 학교’로 나아가는 배경이다.
타인의 뜻에 ‘떠밀려’ 살아오던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처음 선택한 곳.
거기가 바로 상록야학이라고
그는 말한다.

늘 푸른 학교에서
‘더 푸른 학교’로
2022년 10월 25일은 박학선 前 교장이
영면에 든 날이다.
10여 년간 혈액투석을 해왔던 그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던 그 무렵,
한결같이 푸르던 84년 인생과 작별했다.
자신이 입원 중이 던 대학병원에
3억 원을 기부한 직후였다.
가을걷이를 갓 끝낸 농부처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나무처럼, 충만하고
평온한 마무리였다.
故 박학선 교장의 삶과
뜻이 고스란히 담긴 상록야학은
현재 50대부터 80대까지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못다 한 학업’을 잇고 있다.

교사는 약 40명.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내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다.
수업 과정은 각 2년제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난해 새로 생긴 초등학교(1년제),
그리고 일종의 시민학교인 ‘열린강좌’가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중·고교 과정이 상록야학의 ‘중심’이라면,
시니어들의 삶에 지혜를 선사하는
열린강좌는 일종의 시민학교다.
한국어능력, 생활영어, 고사성어와
한자원리, 자서전 쓰기, 컴퓨터,
열린 인문학, 상담심리 등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가르친다.
나이 든 이들을 꾸준히 소외시키는
현대사회 시스템이 못내 안타까워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업들이다.

야학이라는 이름의 ‘치유공동체’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배고픔의 설움과 학업 중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박 교장이
사업이 번창 일로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거꾸로
어려운 이들을 향했다.
“이문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서 시작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과
인근 지역 대학생들 6명이
교사로 참여해 줬고요.
벽보를 붙여 학생을 모집했는데
모두 36명이 오셨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온 그분들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지난해 8월 병석에 있던 박학선 교장이
담담하게 들려준 추억담이다.
상록야학에는 학업 외에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상록의 밤, 일일 호프, 송년의 밤 등
매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졸업식 땐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는다.
제때 학교에 다녔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추억들을 늦게라도 쌓게 해주고 싶어서,
학교 문을 열 때부터 박학선 교장이
마음먹고 실행해온 일이다.
황기연(64) 교무부장의 이야기에서
상록야학이 학업 공동체이기 전에
‘치유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다.
배움의 진정한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임을
이 학교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처럼
박학선 교장은 이제 이곳에 없지만,
그가 남긴 향기는 갈수록 더 그윽하다.
“장례식 때 제대로 알았어요.
남편이 상록야학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를요.
이 학교를 거쳐 간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소중한 추억들을 들려주고 가셨어요.
뭉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는데,
딸아이와 선생님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한윤자 교장의 수줍은 답변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야학 운영이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학교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 ‘보람’이란 말은 너무 거창하고,
‘기쁨’이란 말이 적합할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한 46년에 대해
故 박학선 교장이 밝힌 마지막 소회다.
그가 밝힌 ‘꿈의 등불’은
오늘도 환히 켜져 있다.
'Now > 사회공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김정심 씨 이야기 (0) | 2023.10.20 |
|---|---|
| [살맛나는 세상] 제23회 우정선행상 본상 / 강봉희 씨 이야기 (0) | 2023.10.19 |
|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제23회 우정선행상 시상식 개최 (0) | 2023.09.19 |
| [살맛나는 세상] 큰 사랑을 본받고 싶은 마음 (1) | 2023.08.16 |
| [살맛나는 세상] 닫힌 기억과 마음을 꽃으로 피우다 (0) | 2023.07.19 |